심 물그릇 역할을 하던 저수지도 매립 > 사전질의
심 물그릇 역할을 하던 저수지도 매립
- 등록일 25-08-17
- 조회2회
본문
아니라 광주 도심 물그릇 역할을 하던 저수지도 매립됐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광주 최대 저수지이자 유원지였던경양방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인 1960년대에 매립됐다.
그 위로 택지지구와 도로가 만들어졌다.
경양방죽을 매립해 만든 택지.
1923년에는 광주노동공제회 회장에, 그리고 1927년에는 신간회 전남지회장에 선출된다.
1935년, 일제에 의해경양방죽이 매립될 운명에 처하게 되자경양방죽매립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장을 맡는다.
해방 직후 "혼란스런 광주를 조용하게 만들 인물은.
[동아일보] 1940년 7월 촬영된경양방죽뱃놀이 모습.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제공 광주 도심의 대표적 자연공간이었던경양방죽(계림동 옛 광주시청 자리)은 1968년 매립됐다.
일제가 1940년대 3분의 2가량을 메워 버린 것을 광복 후 광주시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는 화기를 조절하기 위해 신천(新川)의 수량을 보강해 왔다.
광주는 세종 때 김방이라는 인물이 3년간 주도하여경양(景陽)방죽을 만들었다.
부채꼴 모양으로 5만평의 크기에다가 수심은 10m였다.
배를 띄울 수 있는 상당히 큰 호수였다.
광주아시아인문재단 지역사연구소는 13일 오후 2시 무등공부방에서 '광주경양방죽과 태봉산'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첫 번째 공연의 제목은 '개미가 물어다 준 쌀'이다.
조선시대인 1440년 세종 22년 때 옛 광주시청 터에 자리 잡은경양방죽의 축조에 얽힌 설화를 재밌게 연극으로 각색했다.
세종의 농공 정책의 하나로 인조호 축조에 나선 전라감사 김방(농부라는 설도.
공간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주민화합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지역은경양방죽옛터, 4·19민주혁명 발상지, 헌책방거리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 추진가능 지역으로 거점시설에 대한 공간계획.
공간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읍성이 축성되면서 틀이 잡혔다.
1443년(세종25)엔 전라 감사 김방이 축조한 인공호수인경양방죽이 조성됐고,방죽에서 흘러나온 물길은 읍성 해자(성 밖을 둘러 판 못)를 휘감아 돈 뒤 광주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광주의 도시 공간은.
2학년때 어머니가 갑자기 지갑에 돈 다 가져갔지 그러시더라.
도저히 널 감당할 수 없다고 깨끗이 죽자고 어딜로 끌고 가시더라.
경양방죽이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끌려갔는데 어머니가 정말 죽고 싶으셨나보다.
마을을 알리고 주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뭉친 광주 동구 계림동경양마을 주민들 이야기다.
주민들은 마을에 있던 옛 저수지인경양방죽공사에 얽힌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마을의 유래와 역사를 소개했다.
주민들은 시민과 외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마을을 홍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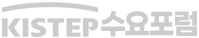
문의처
043-750-2366
E-mail. jihyun@kistep.re.kr